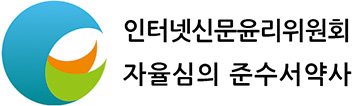‘두쫀쿠(두바이쫀득쿠기)’ 열풍이다. 두쫀쿠 맛을 모르면 대화에 끼지도 못한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를 넘어 이제는 동네 커뮤니티까지 들썩인다. " 17일 입고" " 2시 오픈" "품절" 같은 단어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가격은 6,000원에서 8,000원. 디저트 한 개로는 결코 싸지 않은 금액임에도 사람들은 오픈 시간에 맞춰 줄을 선다.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당류를 멀리 하는 사람도 이쯤 되면 그 맛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역시 동네 커뮤니티를 눈여겨보다 후기가 좋은 디저트 집을 방문했다. 지난주에는 타이밍이 맞지 않아 허탕을 쳤는데 이번에는 마침내 손에 쥐었다. 2주 만이다. 일단, 실물크기가 너무 작아서 놀랐다. 이게 6천 원이라니. 호두빵보다 조금 클까. 보기엔 그냥 초콜릿인데 무슨 맛이기에 이렇게 비싼 걸까. 추운 날씨 버스를 타고 두쫀쿠 한 개를 고이 들고 집에 와 포장을 열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한입 베어무는 순간, 기대와 다르게 "이게 무슨 맛이지?" 하는 질문이 떠올랐다.
분명 독특한 식감은 있는데 압도적인 맛의 설득력은 쉽게 느껴지지 않았다. 맛이 없다고도, 있다고도 말하기 어려운 맛이다. 그리고 이 정도의 기다림과 가격을 감수할 만큼의 감동이었는지도 확신하기 어렵다. 늘 그렇듯 내가 먹은 건 '맛'이 아니라 '유행'이었는지 모른다.
두쫀쿠는 두바이 초콜릿 열풍에서 시작됐다. 얼마 전 한 유명 요리사의 언급에 인기를 끌고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된 것인데 초콜릿, 피스타치오, 카다이프라는 재료로 바삭한 식감을 앞세워 지금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디저트다. 문제는 이 열풍이 개인의 취향을 넘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며칠 전, 개인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이 요즘 힘들다고 하시기에 우리 동네는 두쫀쿠 판매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했더니 "두쫀쿠는 만들지 않지만 열풍 때문에 피스타치오랑 초콜릿 가격이 오르고 품귀현상을 빚어 피해를 보고 있네요"라고 하신다.
수요가 특정 제품으로 몰리면서 원료 가격은 오르고 물량은 일부 업체에 집중되면서 유행을 따르지 않는 소규모 베이커리들은 재료 수급난과 원가 상승이라는 피해를 입었다. 유행에 올라타지 않았을 뿐인데 시장에서는 불리한 위치에 놓인 셈이다.
두쫀쿠를 생각하면 2014년 허니버터칩 품절 사태가 떠오른다. 편의점마다 '품절' 안내문이 붙었고, 언제 들어오는지 묻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심지어 웃돈을 얹어 거래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태에 화가 난 근처 편의점 사장님은 '허니버터칩 안 받습니다'라고 써 붙이기도 했다.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하는 항의성 표현이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맛을 논하기보다 '먹어봤다'는 경험 자체를 소비했다. 시간이 지나 열풍이 식자 허니버터칩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범한 과자가 됐다.
두쫀쿠 열풍은 그때와 비슷해 보인다. 동네 커뮤니티에 오르내리는 단어들, 오픈런 풍경, 높은 가격에도 멈추지 않는 호기심. 품귀현상에 입고가 늦어진다는 빵집의 안내 등 희소성이 욕망을 자극한다. 인증과 경험이 소비를 부추기며 맛의 평가는 뒤로 밀린다. 그럼에도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고, 사람들은 줄을 서거나 온라인 판매 시간을 기다린다. 중요한 것은 맛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이 유행에 참여하고 있다'는 경험이다.
물론 새로운 디저트와 트렌드가 시장에 활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쏠림이다. 너무 빠르게 번지고 너무 한쪽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다양성은 사라지고 부담은 고스란히 시장 전체로 확산된다.
특정 재료에 수요가 몰리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고 그 여파는 다른 빵과 디저트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 두쫀쿠를 만들지 않는 가게조차 원가 상승을 감당해야 하고, 소비자는 비싸진 빵 값으로 결과를 체감한다. 나아가 자영업자는 더 불안정한 환경으로 그 대가를 치른다. 유행 하나가 식품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6,000원짜리 두쫀쿠를 먹으며 느낀 허탈함과 애매한 감정은 단지 개인의 입맛 탓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가. 정말 새로운 맛을 찾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다리고 줄을 서고 지갑을 여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허니버터칩이 그랬듯 두쫀쿠 열풍 역시 언젠가는 식을 것이다. 그 이후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잠깐의 매출 상승 뒤에 남은 소상공인들의 부담, 그리고 또 다른 ‘다음 유행’을 기다리며 반복되는 소비의 습관만 남는 것은 아닐까. 유행에 민감한 사회일수록, 그 유행이 누구를 웃게 하고 누구를 힘들게 하는지 한 번쯤 성찰하는 시선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베어 문 달콤한 한입은 과연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괜찮은 선택이었을까.
전미경 (오마이뉴스 시민기자)